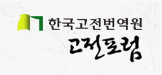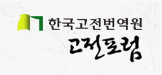|
패랭이꽃은 이맘때쯤 야외로 답사하러 가면 주로 무덤 주변에서 왕왕 눈에 띈다. 그래서인지 현대의 시인들은 이 꽃에서 죽음과 관련한 이미지를 떠올리곤 한다.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애써 밝은 웃음을 짓는 여인의 얼굴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해쓱하면서도 홍조를 띤 다소 애잔한 꽃이라 하겠다. 그러나 줄기를 보면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 생각처럼 또 그렇게 연약한 꽃은 아닌데도, 영물시에 뛰어났던 이규보(李奎報) 같은 시인은 “영락하여 가을 날씨를 견디지 못하니, 죽(竹)이란 이름을 쓰기엔 외람되다.[飄零不耐秋, 爲竹能無濫.]”라고 읊기도 하였다.
이 꽃의 우리말 이름은 꽃송이의 생김새에서 힌트를 얻은 모양이지만 꽃의 자태로 볼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인 듯하다. 이 시에서 말한 대로 외진 곳에 피어 있다 보니 제대로 안목을 가진 임자를 만나지 못한 탓이 아닐까?
정몽주는 자신의 선조이기도 한 저자의 전(傳)을 지어 쟁신(諍臣)의 풍도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동문선》에 저자의 다른 시 두 편도 함께 전해 온다. 이 시는 당시 예종의 귀에 들어가 정습명에게 옥당에 보직되는 행운을 안기기도 하였으니, 시가 사람을 궁하게 하는 것[詩能窮人]이 아니라 시가 사람을 현달하게 한다[詩能達人]는 진사도(陳師道)의 말도 확실히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 시에서 경련(頸聯)은 시의 어법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시는 일반 산문과 달리 형식적인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글자의 순서나 해석의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다. 앞 구는 시골의 연못에 달빛이 비치고 그 환한 달빛에 의해 둔덕에 핀 패랭이꽃이 청초하게 빛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뒤의 구는 방죽의 언덕에 서 있는 나무에서 미풍이 불어와 패랭이꽃의 향기가 내 코끝에 전해진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특히 짧은 번역문에 원의를 다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시골 연못에 비친 달빛과 방죽에 서 있는 나무에서 불어오는 실바람은 석죽화의 운치를 더해주는 것으로, 시인의 심미안과 인생관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를 시답게 해주는 매우 아름다운 구절이다.
《논어》에 보면 “시를 통하여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불평을 토로할 수 있다.[詩可以群, 可以怨.]”라는 말이 있다. 남북조 시대의 시 품평가인 종영(鍾嶸 468~ 518)은 《시품(詩品)》의 서문에서 이 말을 인용하고 나서, “곤궁하고 천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며 세상에 숨어 사는 사람들에게 번민을 없애주는 데는 시보다 좋은 것이 없다.[使窮賤易安, 幽居靡悶, 莫尙於詩矣.]”라고 말하였다. 그렇다. 이 시는 바로 자신의 회재불우(懷才不遇)한 심사를 패랭이꽃에 담아 표현한 것인데, 그 풍유의 격조가 매우 높다. 김종직이 《청구풍아(靑丘風雅)》에서 “40자의 중매[四十字媒]”라고 말한 것은 정곡을 찌른 품평인 것이다.
한편 이 시와 같은 주제를 다룬 것으로 마침 김종직 자신의 작품이 있다.
눈 속에 핀 매화, 비 온 뒤의 산은 雪裏寒梅雨後山
보기에는 쉽지만 그리기는 어려워라 看時容易畫時難
진작 세인들의 눈에 들지 않을 줄 알았다면 早知不入時人眼
차라리 연지로 모란이나 그릴 것을 寧把臙脂寫牧丹
-《점필재집 연보》
16세 때에 과거에 낙방하고 귀향하면서 한강(漢江)의 제천정(濟川亭) 벽에 붙여 놓았다고 알려진 시이다. 역시 뛰어난 문재(文才)의 소유자임에 틀림없다. 세상에 대한 열정도 크지만, 그에 비례하여 실망감도 크다. 그래서 다소 가볍고 치기도 엿보인다. 아직 인생의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 정습명의 시는 슬퍼하되 지나치지 않는[哀而不悲] 격조가 전편에 흐른다. 함축이 잘 되어 여운이 길고 절제 속에 힘이 온축되어 있다.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확실히 격조와 무게 면에서 차이가 난다. 이인로의 《파한집(破閑集)》에 소개된, <기생에게 주다[贈妓]>와 관련한 시화를 보면, 이 시인은 확실히 시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꿰뚫고 있었던 것 같다.
흔히들 20대는 시인, 30대는 소설가, 40대는 종교에 귀의한다고 하는데, 그 말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생의 경험과 식견이 어느 정도 쌓인 40대야말로, 세상에 대한 열정과 문학적 감수성이 있다면, 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나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의 경우 예전에는 이백(李白)의 시가 좋았다. 지금도 좋긴 하지만 점점 도연명의 시가 좋아진다. 도연명의 시를 읽으면 인생의 무게가 느껴진다. 그의 시 중에 <형가를 노래하다[詠荊軻]> 같은 시를 보면 비개(悲慨)한 정조가 넘쳐흐른다.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꽃을 따다가 유유히 남산을 바라보는[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 한가롭게만 보이는 그의 내면에 이런 열정이 숨어 있었나, 새삼 놀라게 된다. 이런 내면의 격정을 승화해 나가는 한편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후세에 충담(冲淡)한 시의 원류로 평가받는 그의 시 세계가 역시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