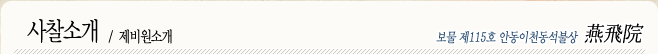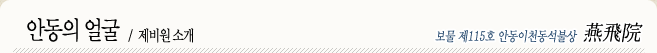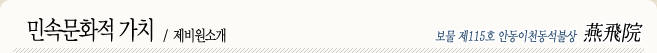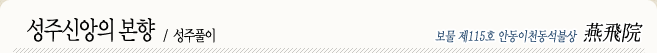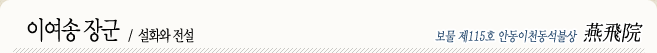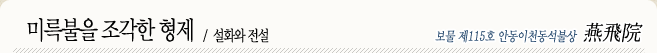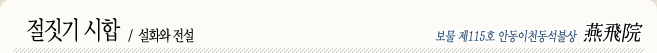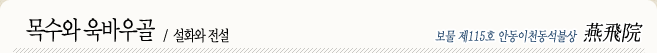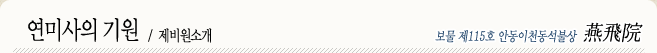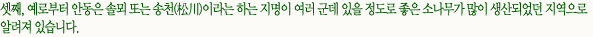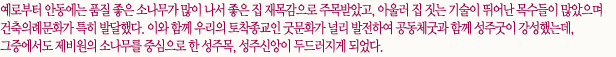7/23일 안동으로 출장을 다녀 오다가 오는 길목의 제비원에서 다시금 인자한 미륵불과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늘 바쁘게 지나치다 사진도 찍고 경내도 찬찬히 들러 보았습니다.
사찰도 새로 건축중에 있었고 안동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여 탐방객이 여유있게
관람하고 참배할 공원을 잘 꾸며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씁니다. 도로가 새로 나면서
좀더 잘 보이는 위치에 미륵불께서 자리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과 '제비원'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자료들을 올립니다.
모텔2010에 오시면 제가 정성껏 담아온 115매의 제비원 미륵상의 사진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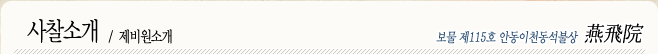 |
 |
 |
 |
|
안동 시내에서 5번 국도를 따라 영주방면으로 3㎞정도 가면 한티재에 이른다. 이 한티재를 넘어 2㎞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국도변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마애불상을 만나게 된다.
이 불상이 바로 보물 제115호로 지정된 안동이천동석불상이다. 속칭
‘제비원미륵불’로도 불리는 이 불상 뒤편에 있는 조그만 절이 바로 ‘연미사(燕尾寺)’ 이다.634년(신라 선덕여왕 3) 명덕(明德)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명덕은 고구려 승려 보덕(普德)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바위에 불상을 새겨 모시고 사찰을 세웠다. 그 뒤 불상을 덮은 지붕이 제비와
비슷하여 연자루(燕子樓)라 하였고, 승려가 거주하는 요사채(寮舍)는
제비꼬리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연미사(燕尾舍)라고 이름지었으며,
법당은 제비부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연구사(燕口寺)라 불렀다.
고려시대 재난으로 불상머리가 굴러 떨어져 파괴 되자 다시 복원하고 전각 중수와 삼층 석탑을 조성하였는데,
이때부터 산 이름이 오도산(五圖山)으로 널리 알려졌다. | |
|
 |
|
|
그러나 조선 중기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하여 연구사는 폐사되기에
이르고 다만 석불만 남아 있었다.
사찰의 이름 마저도 실전(失傳)되어 ‘연비원불사’로만 전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봉정사의 신도 모임으로 등촉계의 일원인 ‘거사림(居士林)’에서 사찰의 창건을 발의하여, 1934년 연미사 (燕尾舍) 유지(遺址)에 사찰을 새롭게 조성하고 구전(口傳)에 따라 연미사(燕尾寺)로 하였다.
법당인 대웅전은 1978년 증축하였는데 기존의 정면 3칸, 측면 1칸의
대웅전을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증축하였다.
1986년 단청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
‘안동이천동석불상’이 위치한 이 지역은 속칭 ‘제비원’으로 불린다. 그런데 이름에서 '원'은 사람들이 여행길에서 쉬어가던 일종의 여관을 뜻한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지방으로 출장 가는 관리들의 숙소로 쓰기 위하여 교통 요지에 있는 사찰을 국가적인 차원의 숙소인 ‘원(院)’으로 지정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영남에서 충청도나 경기도, 또 서울로 갈 때에는 반드시 안동을 거쳐 소백산맥을 넘어야 했는데, 그 길목에 있던 것이 바로 연비원 (燕飛院)이었다. 따라서 연미사(燕尾寺)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전설의 배경이었던 ‘연(燕)’, 즉 ‘제비’에 국가지정 숙박시설인 원(院)이 결합 되어 ‘제비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제비가 날아가는 쪽의 형세라고 해서 ‘연비원’ 또는 ‘연미원’ 이라고 하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석불상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명칭으로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
특히 제비원은 성주풀이에서 ‘성주 본향이 어디메냐,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 일러라’라는 사설에 나오듯이 우리나라 성주민속신앙의 정신적인 근원지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는 뜻깊은 장소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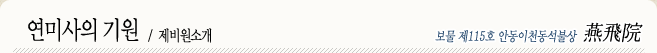 |
|
“연비원불사(燕飛院佛寺)는 부(府) 서북쪽 12리 떨어진 오도산(五圖山) 남쪽에 있다. 큰 돌을 세워 불상을 만들 었는데 높이가 10여 장(丈)이다. 당(唐)나라 정관(貞觀) 8년에 만들었으며 여섯 칸의 누각으로 위를 덮었다. 집 모양이 하늘에 날개를 펴는 듯하다. 뒤에 두 차례에 걸쳐 중창을 하였는데 기둥과 대들보 등의 재목은 다 옛 것을 사용하였다."
燕飛院佛寺 在府西北十二里五圖山南因立 石作佛像高十餘丈唐貞觀八年作六間閣以 覆地飛夢後再次 重創棟樑之材皆因舊焉永嘉誌
|
|
[卷之六 佛宇條 永嘉誌] | |
| 위의 기록에 따르면 석불과 전각의 조성연대가 634년(신라 선덕여왕 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가지가 편찬될 당시인 1608년에도 보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각의 이름은 없고 연미원불사라고 만 기록하고 있어서 사찰의 이름은 이미 실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 |
“보덕법사(普德法師)에게는 11명의 높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무상화상은 제자 김취 등과 함께 금동사를 세웠고, 적멸ㆍ의융 두 법사는 진구사를 세웠고, 지수는 대승사를 세웠고, 수정은 유마사를 세웠고, 사대는 계육 등과 함께 중대사를 세웠고, 개원화상은 개원사를 세웠고, 명덕(明德)은 연구사(燕口寺)를 세웠다.”
師有高弟十一人 無上和尙與弟子金趣等 創金洞寺 寂滅 義融二師創珍丘寺 智藪創大乘寺 一乘與心正 大原等 創大原寺 水淨創維摩寺 四大與契育等 創中臺寺 開原和尙創開原寺 明德創燕口寺…
|
|
[三國遺事 卷第三 寶藏奉老 普德移庵條] | |
|
이 기록에 나타나는 ‘연구사’는 바로 ‘연미사’를 가리킨다. 이것은 자세한 기록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연미사를 지키고 있는 스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제비원 미륵불을 덮은 전각을 짓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기둥을 세운 홈과 주춧돌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제비 모양의
누각이 석불상과 앞면 바위까지의 공간을 덮고 있어서 석굴사원 형식을 띠고
있었으며, 이 공간이 법당이었고 법당의 위치가 바로 제비의 부리에 해당하였다.
그래서 사찰의 이름이 연구사로 불리게 되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승려 보덕법사의 11명 제자 중 한 사람인 명덕이 634년에 불상을 새기고 ‘연자루’라는 전각을 세워 연구사를 창건하였다. 불상을 덮고 있는 전각이 제비 모양과 흡사하여 연자루라 하였고, 승려들이 거처하는 요사가 제비꼬리쪽에 있어서 ‘연미사(燕尾舍)’라 불렀으며 제비부리에 해당하는 곳의 법당을 ‘
연구사(燕口寺)’라 이름지었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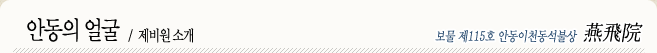 |
 |
|
고려시대의 석불로 자연 암석에 조각하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 얹은 마애불이다.
조선 중기까지 연자루라는 전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마멸이 적은 편이다.
인자하게 뻗은 긴 눈과 두터운 입술, 그리고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는 표정으로
토속적인 느낌이 강한 고려시대 불상 양식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예로부터
안동 지방에서는 ‘제비원미륵’으로 불려졌다. 보물 제 115호로 지정되었다. |
| |
 |
| |
|
불상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경관은 경주 신선암 마애불과 흡사하고, 머리 부분을 따로 조각하여 얹은 점은 파주 용미리 불상과 같은 형식이다.
높이 9.95m, 너비 7.2m의 암벽을 동체(胴體)로 하고 그 위에 2.43m 높이의 머리 부분을 조각하여 올려 놓았다. 파주 용미리 불상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조성한 솜씨는
우수하다. 전체높이는 12.38m이다. |
| |
 |
| |
|
두상의 전면은 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후면은 자연석을 그대로 두었다.
육계(佛頂)나 양각인 백호(白毫), 인자한 긴 눈, 풍부하면서도 날카로운 코, 크고 긴 귀, 부드러운 입매 등은 잘 조화되어 평화롭고 자비로운 얼굴 모습을 하고 있다.
목은 대체로 짧은 편이나 두상과 몸체의 선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며, 목걸이처럼 구슬을 꿴 모양의 연주문(連珠紋)이 새겨져 있다. |
| |
 |
| |
|
법의(法衣)가 양 어깨를 모두 감싸고 있는 형태인 ‘통견의(通肩衣)’의 음각 의문(衣紋)은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가슴의 띠 매듭, 옷자락의 주름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왼손은 가슴까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고 바른손을 내려서 또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품하생인(中品下生印)의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임을 알 수 있다.
음각 의문이 있는 불상 동체에는 몇 구의 작은 마애불이 보이는데, 석불 조성전에
새긴 것으로 판단되며 마멸이 심해 식별하기가 어렵다. 대좌(臺坐)는 큼직큼직한
단판연화문(單辦蓮花紋)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상 동체 남쪽 어깨 위 홈과 앞면 바위위의 홈, 북쪽 어깨위의 초석돌로 미루어,
불상을 보전하기 위한 닷집 형식의 건축물이 석불상 전체를 덮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각을 지칭하는 ‘연자루(燕子樓)’라는 글씨가 불상 정면 북단과 동체 남쪽
암벽, 두 곳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으로 인해
이를 식별하기는 어렵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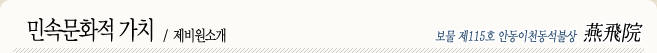 |
 |
|
“성주야 성주근본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으로 솔씨 받아, 소평대평 던졌더니, 그 속이 점점 자라나서,
두리기둥이 되었구나, 낙락장송이 되었구나, 에라 만수~”
제주도에서 함경도까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불려지는 “성주풀이”는 집을 창조한 신에 대한 이야기
형식의 무가이다. 지역에 따라 토리나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집의 신화를 구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성주풀이에서는 이 신화적 내용을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에서 솔씨가 우리 마을로 날아왔고, 이 솔씨가 큰 나무로 자라났다. 이와 같은 나무로 두리기둥을 짓고
대들보를 이었으니, 내 집이 얼마나 평안하고 잘
되겠는가!’ 라고 노래한다. 이렇듯 성주풀이는 자기 집의 성주신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내력을 노래함으로써 집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솔씨가 자라서 재목감이 되고 목수가 이를 다듬어 집을 짓는 과정을 풀어낸다.
노래의 들머리는 대개 성주의 근본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답은 으레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다.
한결 같이 제비원을 성주의 본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짓는 재목으로 쓸 나무가 모두 제비원의 솔씨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 |
 | |
| |
 |
|
제비원에 ‘대부송’이라고 하는 크고 잘 생긴 소나무가 있었는데, 이 소나무의 솔씨를 받아 여기 저기 뿌렸더니 그 소나무가 밤에는 이슬을 맞고 낮에는 햇볕을 받아서 처음에는 바늘침 만하다가 점점 자라서 소부동이 되고 대부동이 되도록 자랐다는 것이다.
소부동은 기둥감이고 대부동은 대들보감을 말한다. 따라서 각 집의 기둥과 대들보가 모두 이 대부송에서 비롯되었기에 안동 제비원이 바로 성주의 본향이자 성주신앙의
발원지(메카)가 되는 것이다. |
| |
 |
 |
|
성주신은 집을 다스리는 신으로 ‘성주대감’이라고도 한다. 가택신(家宅神) 중 하나로 집안의 여러 신을 통솔하면서 가내의 평안과 부귀를 관장한다. 가신(家神) 중에서
가장 웃어른이 바로 성주(成主)이다. 집을 지을 때 상량식과 함께 집안에 모시거나,
집을 완성한 후 무당과 집의 주인어른이 함께 의례를 행하면서 신격(神格)으로
숭배하기도 한다. ‘성주고사’를 지내는 이 날이 바로 집이 탄생한 날짜이며,
동시에 성주신의 생일이 되는 것이다.
성주의 신격을 드러내는 “신체”는 한지로 사각을 접고 깨끗한 나무와 실을 함께
엮어서 만든다. 성주신은 마치 집안의 가장(垈主-바깥어른)처럼 함께 인식된다.
집안의 최고 어른이 죽으면 기존의 성주신체는 땅에 묻거나 태우고 새로이 성주신을 모신다. 성주의 생일에는 의례를 거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성주는 대주를
믿고, 대주는 성주를 믿고”라는 성주풀이의 신화적 구술에서도 드러난다.
성주신은 기와집, 초가집에 관계없이 모셔졌다. 우리네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신분에 구별 없이 어디든지 존재했다. 집은 모든 사람살이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을 창조한 신의 본향, 고향이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으로 올림되는 것은
제비원, 곧 ‘이천동석불상’이 내재하고 있는 민속문화적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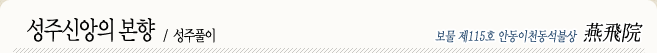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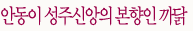 |
 |
|
전국적으로 농촌별신굿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데 안동지역에는 하회별신굿을
비롯하여 병산별신굿, 수동별신굿, 마령별신굿 등이 고려때부터 최근까지 생생하게
전승되었을 뿐 아니라 국보 또는 보물급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회탈춤과
병산탈춤 등의 독특한 전통이 탈과 함께 전승되었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마을굿, 별신굿, 고을굿과 같은 공동체 단위의 굿문화가 강성하던 안동 지역에서 집안굿인 성주굿이 짝을 이루면서 성주신앙이 특히 드셌으리라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
 |
|
달리 말하면 안동에 집을 짓는 문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먼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조 건축 기술이 특히 앞섰고 또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데 따른 각종 의례도 창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주신을 섬기는 제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안동에는 목조건축의 보고라 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전이 있는가 하면, 한국 건축사 박물관이자 건축학도들의 답사 일번지라
할 만큼 훌륭한 목조건축문화재들이 풍부합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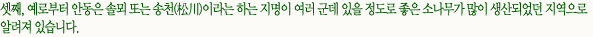 |
|
따라서 건축문화가 고도로 발달하고 굿문화가 함께 발전하면서 성주목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소나무를 성주목으로 섬기는 성주신앙이 두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주목으로 지목되는 안동 제비원의 소나무를 중심으로 성주굿과 함께 성주신앙이 크게 발전했으리라 짐작하기 충분한 것입니다.
이 세가지를 종합해 볼 때, 오늘날까지 안동이 성주신앙의 본향으로 올림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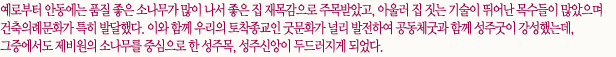 |
| 출처 - 안동문화와 성주신앙 임재해[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
 |
 |
| |
|
신라시대, 고창(古昌)이라고 불린 이 곳에는 여관(당시에는 원이라고 했다)이 하나
있었다. 이 여관에 여덟 살 때 부모를 여의고 심부름을 하는 '연(燕)'이라는
예쁜 처녀가 있었다. 연이는 인물이 예쁠 뿐 아니라, 마음이 고와서 항상 지나는 길손들에게 후대와 적선을 다했다. 방에 불도 따뜻하게 지펴주고, 밥도 후히 담아
주었으며, 빨래까지 빨아주는 연이는 밤늦게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곧바로 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글을 익히고, 내일은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도와드릴까 하는 궁리를 하는 것이었다. |
|
 |
그러는 한편 불심도 대단하여,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마치고 염불을 해서 지나가는 과객들로 하여금 그 알뜰한 정성과 고운 마음씨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웃 마을 총각들도 모두 남모르게 연이를 사모하는 것이었다.
이 원(院)의 이웃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남을 동정할 줄 모르는 성미여서 거지를 보는 대로 내쫓는고약한 위인이었다. 이렇게 인심 고약한 김씨집의 총각도 연이에게
장가들고 싶은 마음이야 다를 바 없었다. | |
|
|
하지만 이런 부잣집에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란 총각도 이 착한 마음씨를 가진 연이 처녀만은 감히 호락호락 범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 총각이 비명에 죽어 저승에 가게 되었다. 염라대왕이 인사를 받고 한참을 기웃거리며 명부를 뒤적이다가 겨우 이름을 찾아서는 능글맞게 이르는 말이, <아니, 자네는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왕 왔으니 인정이나 좀 쓰고 갈 마음이 없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이에 총각이 대답하기를, <지금 전 가진 것이 없는 걸요.>하는 것이었다.
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을 생각하더니, 웃으며 총각을 다시 불렀다.
<이봐, 총각! 자네는 세상에 적악(積惡)한 사람이라 다음에는 소로 환생할 것이다.
자네의 창고는 텅 비어 있지만 자네가 사는 건너 마을의 원에 살고 있는 연이는
착한 일을 하여 창고에 많은 재물이 쌓여 있은 즉, 그걸 좀 꾸어 인정을 쓰고 가렀다. |
|
|
이 말에 그 총각은 많이 놀랐지만, 다시 살아서 돌아간다는 기쁨에 연이의 재물을 꾸어 쓰고는 다시 세상에 돌아왔다. 돌아온 즉시
총각은 연이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이에 연이는 그 재물을 모두 부처님을 위해 쓰리라 마음 먹었는데, 마침 석불이 비바람에 시달리고 있어, 도선국사로 하여금 석불을 중심으로 하여 큰 법당을 짓도록 하였는데,
이 공사가 막대한 것이어서 5년이란 긴 세월이 걸렀다. |
 | |
|
|
법당을 짓던 마지막 날, 기와를 덮던 와공(瓦工)이 그만 잘못하여 높다란 지붕으로부터 떨어지니, 온 몸뚱이가 마치 기왓장이 깨진 것처럼 산산조각이 되었고, 혼은 제비가 되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이에 이 절을 '제비사(燕飛寺)' 또는 '연미사(燕尾寺)'라 부르고, 이 곳을 제비원 또는 연비원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연이는 그 나이 서른여덟이 되던 해 동짓달 스무 사흗날에 처녀의 몸으로 죽게 되었다. 그 날 저녁에는 온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큰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지금의 돌부처가 생겼다고 한다. 돌부처는 연이의 죽은 혼이 변하여
생긴 것이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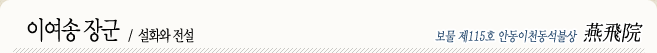 |
 |
| |
|
제비원 미륵불의 머리 부분은 지금부터 350여 년 전 조선시대에 다시 올려놓은
것이라 한다. 그것은 이여송이 미륵불의 머리 부분을 칼로 쳐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에 청병으로 명나라에서
온 이여송(李如松)은 난이 평정되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찾아다니면서
훌륭한 인물이 날 자리를 골라 혈(穴)을 끊었다고 한다.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던 이여송이 말을 타고 제비원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말이 우뚝 서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상히 여긴 이여송이 사방을 둘러보니 큰 미륵불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필경 저 미륵불 때문에 말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여송은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미륵불의 목을 쳐서
떨어뜨려 버렸다. 그때서야 말발굽이 떨어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 칼에 베인
까닭에 미륵불의 목 부분에는 아직까지 가슴으로 흘러내린 핏자국이 있고,
왼쪽 어깨에는 말발굽의 자국이 있다.
당시에 떨어진 목은 땅바닥에 굴고 있었는데, 어느 스님 한 분이 와서 떨어진 목을
제자리에 갖다 붙이고, 횟가루로 붙인 부분을 바르면서 염주 모양으로 볼록볼록
나오게 다듬어 놓았다. 지금 보면 이은 자리는 마치 염주를 목에 걸어 둔 것 같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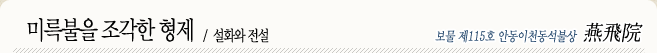 |
 |
어떤 형제가 일세(一世)에 뛰어난 조각가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다.
형제는 서로 뒤질세라 쉬지 않고 조각하는 일을
계속하던 중 문득 일세에 제일가는 조각가는 둘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
| |
|
형제 가운데 어느 한쪽은 당대 제일의 조각가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둘째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제는 의논한 결과 제일의 조각가가 되려고 하나, 필시 하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인즉, 내기를 하여 지는 사람이 죽기로 했다. |
| |
|
내기는 미륵을 만드는 것이었다. 일정한 날을 두고
동생은 훌륭한 미륵을 만들려고 열심히 돌을 갈고
다듬었으나, 형은 빈둥빈둥 돌아다니며
놀기만 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동생은 그 날까지
미륵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형은 미륵의 머리만 조각하여 바위 위에 가져다 얹어 훌륭한 불상을 만들었다.
동생은 내기에 진 까닭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우의 미완성 조각은 개천에 굴러다닌다고 한다.
지금 제비원 미륵불상의 목 부분을 보면 이어서 만든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이것은 형이 머리부분만 조각하여 붙였기 때문이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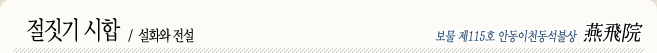 |
 |
| |
|
안동시내에 법룡사는 사찰이 있었다. 6.25때 타버려서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는데
신라 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다래 덩굴이 절 둘레를 에워싸고 있어서
사람들이 기어들어가고 기어 나왔다고 한다.
법룡사의 유래담은 제비원의 그것과 관련되어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옛날에 절을 짓는 기술이 비슷하게 뛰어난 두 대목이 있었다. 기술이 막상막하였기
때문에 서로 경쟁의식이 강했으며 이 나라 제일의 큰 대목이 되려고 늘 애썼다.
그러던 참에 법룡사와 제비원 절을 지으면서 내기를 하기로 했다.
"자네가 법룡사를 먼저 짓느냐, 내가 제비원 절을 먼저 짓느냐 내기를 하세. 그래서
누가 이 나라 제일의 목수인지를 판가름하세.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나는 자신 있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일세. 내가 법룡사를 먼저 지어서 뒤편에다가 "천년도읍지"라는 현판을 달며는, 아마 그 서기(瑞氣)가 제비원까지 뻗칠 것이니 그렇게 알게."
"자네 큰소리 치지 말게. 나는 제비원을 법룡사보다 먼저 짓고
한티재를 넘어 올테니 두고 보세. "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각자 열심히 절을 짓기 시작했다.
제비원 절을 짓는 사람이 절을 하고 한티재 위에 막 뛰어올라가 보니
법룡사 뒷편에 "천년도읍지"자른 현판 글씨가 광채를 내고 있었다.
그 서기가 한티재에 까지 비친 것이다.
법룡사를 지은 대목이 경쟁에서 이긴 까닭에 "예, 이놈아!" 하고 큰 소리로 호령을 하는 것이었다. 제비원 절을 지은 대목은 자기가 경쟁에서 진 것을 깨닫고는
"내가 자네한테 졌다. 그러나 내가 죽어도 내가 지은 절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한
내 이름도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소리쳤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절의 지붕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뛰어내렸다.
지붕에서 뛰어내리자 마자 제비가 되어 푸른 하늘 위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뒷 사람들이 이 절의 이름을 제비가 되어 날아갔다 하여
"연비원(燕飛院)"으로 지었다.
지금 법룡사는 불타 없어졌지만 아직도 연비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연비원은 현재 안동시 이천동 아랫지르네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제비원 미륵불도 이 곳에 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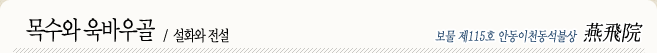 |
 |
제비원 절에는 난간이 있었다. 목수가 이 절을 훌륭하게 짓기 위하여 난간집을 짓기로 구상했다.
목수는 밑부분부터 정성을 들여 차례차례 지어 올라갔다.
절을 짓는데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절을 다 지은 뒤에 내려 갈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
목수는 처음에 구상한대로 아주 높고 멋진 난간집을 지었다.
그래서 지붕의 난간위에서 제비가 되어 날아 나갔다. | |
| |
|
목수가 절을 다 짓고 제비가 되어서 날아 나갔다고 하여 지금도 제비원으로 불린다고 한다.
또 이천동 제비원을 넘어 가면 욱바우골이라고 있다.
제비원의 미륵불이 만들어지기 전에 큰 바위 둘이 서로 그 자리에 가서 좌정하려고 하였으나 현재의 미륵이 먼저 가서 좌정하는 바람에 바위 하나는 지금 욱바우골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현재의 미륵불은 자리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불도들이 받들어 모시는 미륵불이 되었는데 이 바위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바위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것이 원통하게 여겨진 이 바위는 울면서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우는 바위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우는 바위라고 하여 이 바위를 욱바위라 부르고 욱바위가 있는 골을 욱바우골이라고 한다.

| | | |